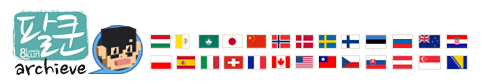하루에 한숨을 얼마나 쉬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다.
의식하고 헤아려 보니 한숨 속에 살고 있었다.
[엑스맨: 아포칼립스] CGV 판교 IMAX
<시빌 워>에서 대두된 통제와 자유의 대립은 비슷한 뉘앙스로 <엑스맨> 시리즈에 늘 깔려있는 갈등구조였다.
인간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한 내분은 같지만, <엑스맨>의 세계관은 철저한 소수자로서 뮤턴트들이 취하는 태도에 집중한다.
그 중심엔 교육을 통해 조화를 추구하는 프로페서X와 분노를 바탕으로 저항의 길을 걷는 매그니토가 있었고,
양축이 반목과 화합을 반복하며 강자와 약자, 차별과 불평등에 관한 담론을 형성해왔다. 어쩌면 순수했던 양자의 대립은
모든 걸 파멸시키는 진 그레이의 존재를 통해(최후의 전쟁), 인간의 적개심의 산물인 센티넬을 통해(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) 공통의 적으로 옮겨갔고,
급기야 돌연변이의 시조라는 끝판왕을 맞이한 것이다. 기대감의 개연성 측면에서 인류에게 '그냥' 화가 난 아포칼립스가 좀 레벨에 안맞는 느낌이지만,
난 이 시리즈의 스토리가 그냥 너무너무 재밌다. 그게 또다시 브라이언 싱어여서 더욱 더.
[싱 스트리트] CGV 인천
얼마전 <브룩클린>도 그렇고, 요새 접하는 아일랜드 배경의 영화는 먼가 '노답'의 나라 같은 느낌이다. 희망이 없어서 탈출해야 하는 나라랄까?
이상하게 관심이 더 가고 깊이 알아보고 싶어지는 건 왠지 모를 익숙함 때문일까? 어쨌든 영화자체는 경쾌하고 포근하다.
<원스>도 그렇고 <비긴 어게인>도 그렇고, 이 감독은 이제 음악과 드라마를 조합하는 역량으론 경지에 오른 것 같다.
'8Kun' Friends > 와치무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무비] 6월 둘째주 - 정글북, 워크래프트: 전쟁의 서막, 컨저링2, 본 투 비 블루 (2) | 2016.06.17 |
|---|---|
| [무비] 6월 첫째주 - 아가씨, 미 비포 유, 무서운 이야기 3: 화성에서 온 소녀, 곡성 (0) | 2016.06.15 |
| [무비] 5월 셋째주 - 하드코어 헨리, 나의 소녀시대, 얼리전트, 계춘할망, 제3의 사랑 (0) | 2016.05.27 |
| [무비] 5월 둘째주 - 곡성 (0) | 2016.05.20 |
| [무비] 5월 첫째주 - 탐정 홍길동: 사라진 마을, 하나와 미소시루 (0) | 2016.05.11 |
댓글 :
![]()